구름 사이로 이따금씩 비치는 햇살이, 군불지핀 아랫목처럼 포근하게 안긴다.
차창밖으로 보이는 들녁 마다의 풍경들이 넉넉함으로 다가오는 오후.
모처럼 호강에 빠진 두눈이 한폭의 도화를 걸어놓은 듯한 가을 정취에
흠뻑 젖어든다.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갈 무렵 난 과수원집 딸이 되었다.
온각 곡식들을 심어오던 언덕바지 밭들이. 과수원으로 탈바꿈 했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 이웃 집 사과밭을 지나칠때 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빨간 사과가 먹고싶어 꼴깍꼴깍 매번 침을 삼켜오던 일에,
아버지께서는 작심을 하셨던 모양이다. 그때는 기계화가 되지
않을 때여서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구덩이를 파야 했으므로 크고작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러고도 한 그루 한 그루씩 거리를 맞춰가며 심자니
오랜시간이 걸렸다. 그러하신 부모님의 수고로움은 고사하고 , 과수원이
생긴다는 일념 만으로 가슴이 벅차 , 친구들에게 자랑을 일삼았다.
애동 나무(어린 묘목)가 해를 거듭 할 수록 따문따문 사과가
열리기 시작 했을때는, 정말이지 꿈만 같았다.
신작로를 따라 학교를 오가면서 과수원을 닳도록 쳐다보고 또 쳐다봐도
마냥 좋기만 했다. 하지만 과수원이 생기고 부터는 부모님의 일거리는
배로 늘어났다. 나무가 커가고 수확이 늘어 날 수록 잠시도 손 놓을 틈이
없으실 만큼 잔손이 많이 갔다.
봄이오고 새하얀 사과꽃이 눈꽃처럼 떨어지고 나면, 질세라 앞다투어
다닥다닥 열매들이 맺힌다. 비오면 비 맞고 햇살 주면 주저없이 햇살
받아먹으며, 콩알 만하던 사과가 구슬 처럼 커가면, 일일이 손으로
솎아 주어야 한다. 꼬투리 마다 제일 알차다 싶은 열매 하나씩만
남겨두고 모조리 따내야 하니 쉬운 일이 아니다.
목은 말할 것도 없고니와 팔이며 어깨가 빠질 듯 통증이 따른다.
가지가 축 늘어져 키가 닿는 곳은 다행히 접과가 수월 한데,
높은 곳에는 사다리나 나무꼭대기에 까지 올라가서 하나하나 잘
따주어야 한다. 그럴때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도맡아 하셨다.
힘들고 위험한 일에도 아랑곳 않으셨던 건, 순전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함 이셨다. 가장 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기에 고단함을
속으로 삭히시며 한평생을 힘들게 살아 오셨다.
사과 접과가 한번에 끝이나면 얼마나 좋을까.
손질이 덜 된 곳은 열매가 굵어질수록 눈에 잘 띄기에,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보이는 쪽쪽 부지런히 솎아주는 일이 반복된다.
햇빛쨍쨍 무더운 날 과수원에 농약을 쳐야 하는 일 또한 버거운 일이다.
약줄을 풀었다 당겼다를 되풀이 해야 하니 그 무게만도 만만 찮다.
저녁이면 밥 숟갈 들기 조차 힘들다시던 아버지 푸념을 .지나는 귓등으로
흘려 들었으니 얼마나 죄스러운지 모르겠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수확 하기까지, 여든 여덟번의
손을 거친다고 한다. 콩죽같은 비지땀 흘리시며 총총 잔별이 박힐 때까지
억척으로 살아오신 아버지! 감사 합니다.
낮달에 걸쳐진 그리움 한점에 가슴 먹먹해지는 오늘이다.
노사연의 바램
님 그림자 신청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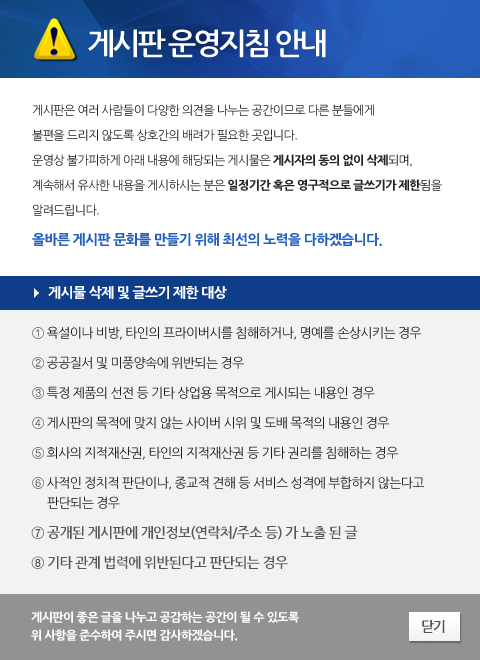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