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다란 가마솥에 밥을 앉히고, 뚝딱뚝딱 찬거리를 준비하는
어느 시골 마을의 소박한 모습들이 티비를 통해서 나온다.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소소한 정을 나누는 풍경들이, 꼭 내 어린 날
정겨움들을 보는 것 같아 눈을 뗄 수가 없다.
어릴 적 친정에는 쌀이 귀했다. 가마솥에 푹 퍼진 보리쌀을
자근자근 펴 깐 엄마는 한줌의 쌀과 감자를 소복이 앉혔다.
아궁이 가득 활활 장작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구수한 밥내가
이내 군침을 삼켰다. 연신 꼬르륵 대는 허기진 배를 움켜 잡은 채
마당을 서성이다 보면 , 솥뚜껑 여는 소리가 그리도 반가울 수가 없었다.
허연 한김이 나가길 기다리던 엄마는 쌀밥을 덮은 보리쌀을 밀쳐내고
살살 일군 쌀밥 한 주걱을 폭 떠서는 얼른 손님상에 올렸다. 동글동글
잘 익은 감자와 근기없는 꽁보리밥만이 여덟 식구들의 유일한 양식이었다.
행여나 손님이 '쌀 밥 한 숟가락이라도 남겼으면...'
하고 바라던 날 싹싹 긁어 빈그릇으로 나올때면 그렇게도 서운 할 수가 없었다.
그 해는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계곡물이 넘치는 바람에 그 높은 논둑이
무너져 한창 자라는 벼를 모조리 덮치고 말았다. 흙더미에 깔려 쓰러진 벼를
부모님은 애써 일으켜 단단히 묶어 주었지만 엎친데 덮친격으로
병충해까지 극성을 부렸다. 그나마 겨우 살아남은 벼 이삭들을 마구
갉아먹어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이 다반사였다. 가을이 되어 타작을 했지만
절반이상 줄어든 수확에 부모님의 한숨 소리는 땅이 꺼질 듯 깊어만 갔다.
식량으로 남겨둘 형편이 아닌지라 모조리 매상을 해야했다.
그래야만 한푼이라도 만질 수 있었으니 말이다.
공납금도 제때 낼 수가 없었다. 학교에서 독촉장이 날아오고 정해진 날짜를
지키지 못한 날은 어김없이 교무실로 불려갔다. 쳐다보시는 선생님들 모두
'공납금 못내 불려온 학생' 으로 낙인 찍을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있자니
죄인 같았다.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 안 드려도 눈치채실게 뻔했다.
다음날, 이웃집에 들러 혀궂은 소리 해가시며 겨우 빌린 돈을
내 손에 꼭 쥐어 주시던 아버지 투박하신 손이 파르르 떨렸다.
아버지 좋아 하시던 노래
나훈아의 고향 무정
배호의 장충단 공원
신청 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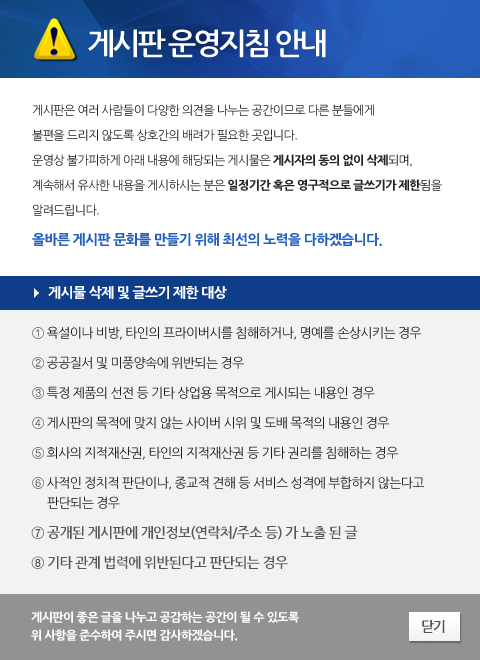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