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또 뭘 해먹지!'하는 고민이 앞설때 마다 습관적으로
냉장고를 뒤적인다. 냉동실 문 끝 자리에 기댄 채 올망졸망 몸을 부비는
손가락 어묵이 얼른 꺼내 달라며 쟁쟁 거리는 것 같아, 덥썩 집어 들었다.
발끝에 채이는 것들 온통 먹거리 풍년이라는 좋은 세상에 살지만
분명 필요해서 샀을때는 언젠데 까맣게 잊고 있었으니 말이다.
어묵 국물로 배채우던 시절 엊그제 같건만, 코앞에 두고도
먼산 보듯 했음은, 물질 만능 시대에 묻혀 잊고 사는 내가
간사하기 짝이없다.
국민 학교다닐때 어묵 한개의 값은 20원 이었다.
교문을 나오면 문방구가 바로 보였고 그 옆자리에 자리한 낡은 구루마에는
추운 겨울이면 언제나 따끈한 어묵을 팔았다.
길다란 꼬챙이에 쑥쑥 끼워 푸짐하게 담궈둔 양재기 앞으로, 공부를
마친 아이들은 늘상 와글와글 벌떼처럼 달려 들었다.
큼지막하게 뚝뚝 따갠 허연 무쪼가리며 대파 양파로 푹~ 우려낸
들쩍지근한 어묵국물이야말로 추위에 발발 떨리는 몸을 뎊혀주는데는
그만 이었다.
늘 호주머니가 빈약했던 난 20원 짜리 어묵 하나에 너댓바가지의 국물을
주인 눈치 살펴가며 홀짝홀짝 마시는 날이 많았다.그런 나를 주인은
일찌감치 눈치를 채면서도 한번도 핀잔을 주는 일이 없었다.
또래들 보는 앞에서 '국물 좀 그만 먹어라.'며 다그치셨다면
어린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까.
세상없이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 붉그락 해진 얼굴로 구루마 앞을 차마
고개들고 다니지 못했을 것이 뻔하다.
연륜으로 봐서 세상 떠나신지 오래되셨을 구루마주인님께
늦으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 생뚱 맞을런가.
허기진 배를 빵빵하게 어묵국물로 채운 날 신바람이 나서 집으로
달려 갈때면 뱃속이 파도치듯 출렁 거렸다.
집으로 오는 내내 입속을 맴도는 오묘한 어묵 국물 맛의 여운이
오래도록 향기로웠다.
둘 다섯의( 긴 머리 소녀)
( 밤배) 신청 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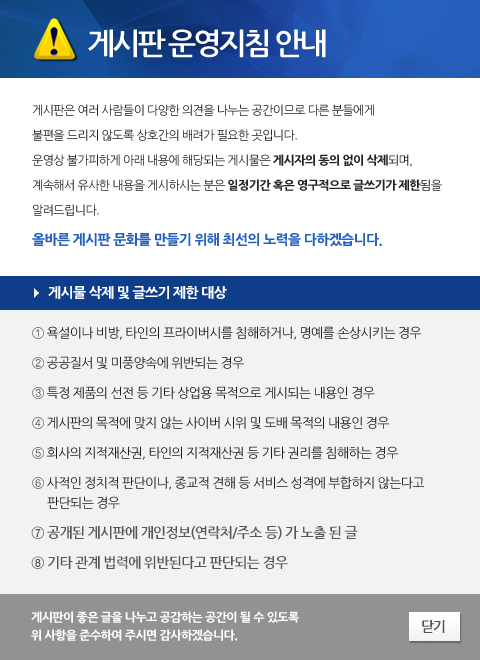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