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학용품 귀한 줄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몇 십년 전만 해도, 연필 한 자루가 참 소중하던 때가 있었죠.
소비가 아닌 저축이, 낭비보다는 절약이 덕목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필통에 어김없이 들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몽당 연필 한 두자루였죠.
손으로 잡을 수 없을 만큼 짧아진 연필!
명을 다해 죽음을 기다리는 사망선고 받은 연필!
그 길이가 잘달막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몽당연필이었죠!
요즘 같으면 아까운 줄 모르고 버릴 연필이지만, 그 시절 학생들은 볼펜깍지에 끼워서,
연필의 최후의 끝까지 썼습니다.
어디 연필뿐이겠습니까!
구멍뚫린 창호문은 풀을 묻힌 종이 조각 하나로 겨울바람을 막는 철벽이 되었습니다.
구멍난 양말은 전구를 넣고 깁고 깁는 어머니의 바느질 신공으로 나중에는 원래
양말의 색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신고다녔죠. 찢어진 책가방도 프랭캔슈타인처럼
얼굴과 옆구리 이곳저곳을 꼬매고 긴긴 생을 이어갔습니다.
궁색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삶에 대한 깊은 반성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요?
삶은 아무리 찢기고 구멍나며 깎이어도 다시 시작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풍족한 물질문명 속에서, 수십 자루의 연필이 분리수거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지금!
구멍나서가 아니라, 유행에 지났다고 가방이 버려지는 오늘!
삶은 더 이상 새로워질 것도,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없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이
되었습니다.
삶은 현실을 벗어남으로써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구름이 세상을 덮고, 포기만이 유일한 가능성으로 보이는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깁고, 꼬매며, 구멍을 매우는 노력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정오의 태양과 같은 중년의 언덕을 이제 막 넘어가는 제 삶에도
깁고, 꼬매며, 매워야 할 수 많은 구멍이 있음을 봅니다.
또한 그 절망과 좌절의 구멍이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췰 수 있는 통로가 됨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강산에 - 넌 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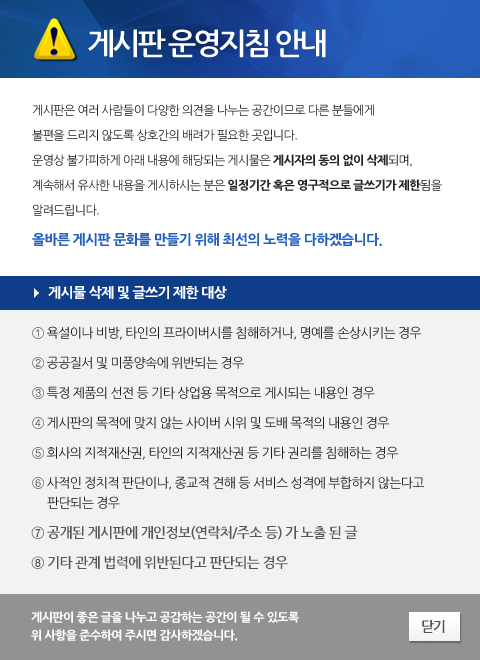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