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이 따갑게 내리 쬐던 오후 한가로이 유모차를 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른다.
" 윤미야~~~!!"
반가워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다.
내 앞의 꼬마가 엄마에게 달려간다.
아~ 맞다! 여기는 내 이름 불러줄 사람이 없는 낯선 부산이라는걸 순간 깜박했다.
부산에서 산지 4년이 되었지만..
여기서 나는 '준혁이 엄마'다.
그 멀리서 누가 불러도 ' 윤미야' 보단 '준혁아'에 뒤를 돌아봐야 하는...
또는 '백윤미씨'다. 은행 병원 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지만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말투일뿐이다.
아는 사람이라곤 신랑 밖에 없는 부산으로 시집와 신혼초엔 신랑 퇴근 하기 전까지 사람 눈을 보고
말을 할 일이라곤 슈퍼 캐셔 아줌마, 세탁소 아저씨..돈을 지불해야만 대화가 가능한 사람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목욕탕 때밀이 아줌마가 때를 밀며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외로웠던 나머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던 적도 있었다.
시집 오기 전 나는 시골에서 살았다.
좁은 시내를 나가면 인사를 몇번이나 해야되고, 목욕탕에 혼자 가도 꼭 누군가 아는 사람을 만나
등을 밀고 오고, 같은 또래는 거의 같은 학교를 나왔기에 모두 친구다.
누구집에 무슨일이 나면 금방 온 동네 소문이 나고 그렇게 너무 다 알고, 좁아서 참 싫고 답답했다.
그치만 그땐 누군가 " 윤미야" 라고 하면 정말 나였다.
좁고 답답했던 나의 고향에서 난 항상 도시의 자유로운 생활을 그리워 했는데..
도시 생활 4년만에 모두 가족같은 나의 고향 사람들이 너무 그리워진다.
누군가 친근하게 반가운 목소리로 부르는 내 이름이 듣고 싶다.
어쩜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내 이름을 불리던 그 시절이 그리운 걸지도 모르겠다.
( 제 이름 친근하게 한번만 불러 주세요~)
윤미야~~ 백윤미~~~!!
신청곡 아이유 이름에게 신청해요
외로운 저에게 고기 주시면 먹으면서 외로움을 달랠수 있을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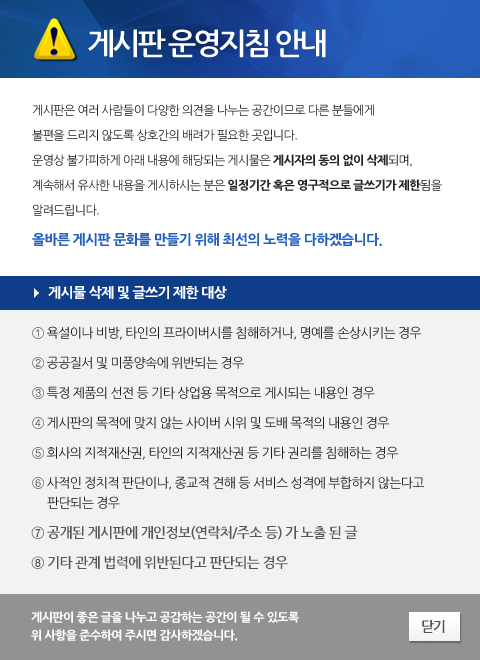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