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이었습니다. 혜은이 씨의 〈제3한강교〉가 집집마다 울려 퍼지던 해였죠. 온 세상이 그 노래로 흥겨워하던 동안, 저는 천안의 허름한 단칸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스물여섯. 한창 예쁘고, 웃고, 꿈꿔야 할 나이였지만 제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과 좁은 방 한 칸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요즘 스물여섯 살들은 어떤가요. 스마트폰만 켜면 온 세상의 아이돌을 만나고, 밤새도록 그들의 노래와 영상을 보며 웃고 떠들 수 있겠죠. 하지만 1979년의 스물여섯 살, 저에게는 손에 쥔 스마트폰 대신 두 아들의 손이 있었고, 아이돌의 얼굴 대신 칭얼대는 아이들의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큰애는 일곱 살, 작은애는 그보다 더 어렸습니다. 아이들이 방 안을 온종일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 틈에서, 저는 밥 짓고 빨래하며 하루를 밀어냈습니다. 그때는 딸 가진 엄마들이 참 부러웠어요. 아들만 둘이라는 이유로 “목 맬 팔자”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듣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저보다 열 살이나 많았고, 감정 표현에는 퍽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던 그이는 제가 힘든 것을 알아채주지 못했고, 저는 그런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집엔 TV도 없었습니다. 가끔 들려오던 라디오 소리마저 우리 집 것이 아니었죠. 옆집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 혜은이의 목소리로 흐르던 〈제3한강교〉가 들릴 때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중간에 무언가 끼어들었죠. 애들이 다투거나, 밥이 끓어넘치거나, 방 안이 엉망이 되거나.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말했습니다.
“혜은이, TV에서 봤다.”
그 말이 어찌나 부럽던지. 흑백 텔레비전이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그때 저는 혜은이가 어떤 옷을 입었을까, 어떤 표정으로 노래했을까,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 상상이, 팍팍한 삶 속 유일한 사치였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레슬링을 하다가 그만 요강을 엎었어요. 바닥으로 오줌이 강물처럼 퍼져나가는 걸 멍하니 보는데, 또 어디선가 그 노래가 들려오는 겁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순간 헛웃음이 났어요. ‘그래, 여기가 바로 한강이구나.’ 우리 방바닥에도 강이 흐른다고 혼자 중얼거렸죠. 그러곤 다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아이들 엉덩이를 몇 대씩 때렸어요. 그때는 저도 젊었으니까요. 힘도 많았고, 화도 참 쉽게 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때 그 아이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큰아이가 벌써 쉰둘, 막내는 쉰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참 멀리도 흘러갔네요.
그래서요, 이번에는 정말로 혜은이 씨의 〈제3한강교〉를 제 눈앞에서, 편히 앉아 듣고 싶습니다.
그때는 끝내 다 듣지 못했던 그 노래, 이제는 제 마음으로 끝까지 듣고 싶어요. 아이 울음소리도 없고, 엎질러진 요강도 없고, 밀린 설거지도 없는 자리에서요.
그것이 그 시절의 저에게, 지금의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조용한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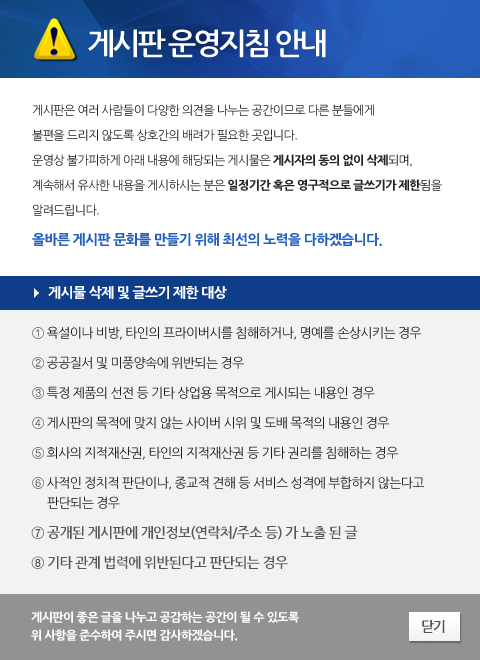
혜은이씨 보고싶어요
송희
2025.07.15
조회 30


댓글
()